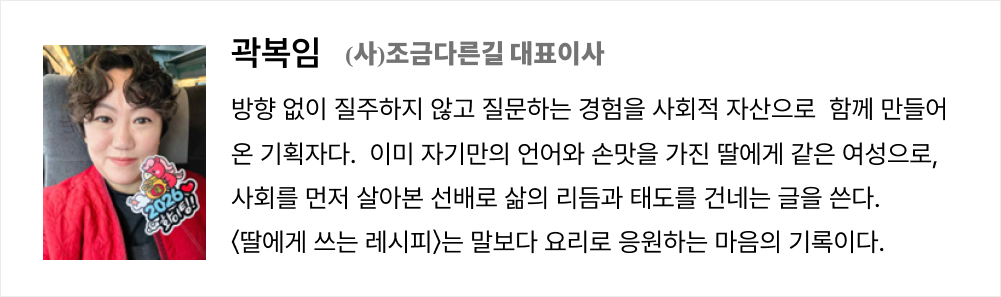[딸에게 쓰는 레시피] ep1. 병오년 아침, 떡국꽃이 피었습니다
새 해 첫 날 아침 꽃떡국 Ⓒ뽀기미
[딸에게 쓰는 레시피] 연재를 시작하며
이 글은 요리를 가르치기 위한 레시피가 아니다. 삶을 대신 살아주는 조언도 아니다. 이미 자기만의 언어가 있고, 자기만의 손맛이 있는 딸에게 나는 다만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이럴 때,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딸은 글을 쓰는 사람이고, 요리를 아는 사람이다. 자격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재료를 고르고, 불을 보고, 기다려야 할 순간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연재에서 나는 딸을 가르치지 않는다. 앞서 걷지도 않는다. 한 발 옆에서 같은 여성으로, 조금 먼저 사회를 살아본 선배로 내가 살아온 리듬과 태도를 한 그릇씩 올려둘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딸의 가장 열성적인 팬이기에 말보다 요리로 응원하고 싶었다. 이 글에 등장하는 음식들은 완벽하지도, 새롭지도 않다. 다만 ‘오늘도 네 편이다’라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전하고 싶어서 차려진 밥상이다.
이번 연재는 딸에게 쓰는 글이지만 딸만을 위한 글은 아니다.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선배가 되었고, 지금은 또 누군가의 편이 되어 살아가는 당신을 이 온라인 식탁으로 초대하고 싶다. 천천히 읽어도 좋고, 한 편만 읽고 일어나도 괜찮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음 대신 잘 웃어도 된다는 마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으면 한다.
그래서 오늘의 메뉴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따뜻하게 담은 글 한 편과 마음을 조금 녹이는 음식이다.
ep1. 병오년 아침, 떡국꽃이 피었습니다.
병오년의 첫 아침, 냄비에 물을 올리고 불을 켰다. 물이 끓기 전까지의 시간은 늘 비슷한데, 그 기다림의 냄새는 매번 다르다. 마늘을 다질 때 손끝에 남는 알싸함, 국간장을 한 바퀴 두르고 숟가락으로 저을 때 바닥에서 올라오는 잔잔한 소리를 듣는다. 불 앞에서 급해지지 않고, 국물이 맑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즐긴다.
나는 새해 첫 사흘 아침마다 떡국을 끓였다. 하루는 알록달록 떡을 담그고, 하루는 흰 떡 사이에 색색의 꽃을 피웠다. 마지막 날엔 매생이 초록 밭에 떡국꽃을 피웠다. 떡을 넣기 전, 육수의 향을 한 번 더 맡고 거품을 걷어내며 국물의 색을 살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떡국은 하루만 먹어도 되고, 꽃 모양 떡은 기념으로 몇 개만 올려도 된다. 그런데도 나는 다시 불을 올리고, 다시 국자를 들었다. 이왕이면 올해 네가 앉게 될 모든 식탁에 사랑꽃과 웃음꽃이 먼저 피었으면 해서. 그 마음을 말로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떡국 한 그릇으로 먼저 꺼내 보고 싶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무엇을 결심했는지부터 묻는다. 나는 요즘, 결심보다 아침의 반복을 더 믿는다. 첫날 마음을 내고, 둘째 날 다시 간을 보고, 셋째 날 또 한 번 불을 붙이는 일. 그건 포기가 아니라 손을 놓지 않았다는 증거에 가깝다.
너도 알지. 요리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 불은 조절해야 하고, 국물은 한 번 더 맛봐야 하고, 간은 다시 맞춰야 한다. 그래서 엄마는 너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지 않았다. 이미 너는 재료의 상태를 읽고, 기다려야 할 순간을 아는 사람이니까. 다만 ‘이럴 때 나는 이렇게 해왔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면 다시 불을 켜고, 다시 냄비를 올렸다고.
새해 첫 사흘의 꽃떡국은 대단한 요리가 아니었다. 그저 오늘도 네 편이라는 신호였고, 오늘도 다시 마음을 내보겠다는 표시였다. 앞으로의 네 인생에도 이런 아침들이 올 거야. 한 번에 되지 않는 날들, 다시 시작해야 하는 날들. 그럴 때마다 꼭 떡국을 끓일 필요는 없다. 다만 기억해 줬으면 한다. 마음은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다시 낼 수 있다는 것. 병오년의 아침, 떡국꽃이 피었다. 나는 그 아침을 너에게 먼저 건네고 싶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진다.
너라면, 다시 마음을 내야 하는 날에 어떤 아침을 고르겠니?

2026년 1월 1일 아침 꽃떡국 Ⓒ뽀기미

2026년 1월 2일 아침 꽃떡국 Ⓒ뽀기미

2026년 1월 3일 아침 꽃떡국 Ⓒ뽀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