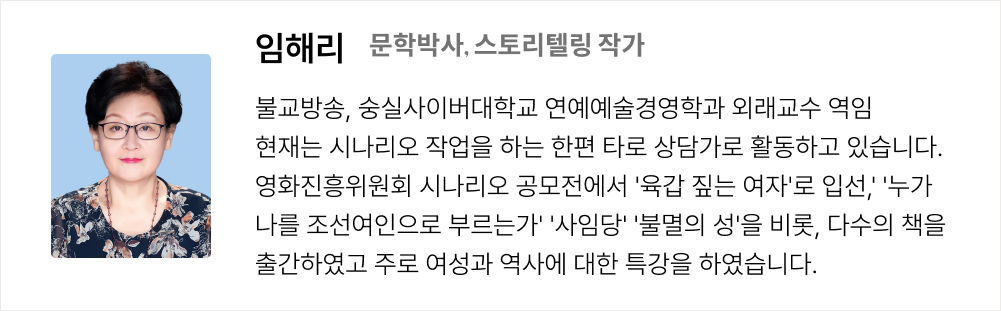영화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가 던지는 ‘우리’의 삶
1998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 소개된 상드린 베세 감독의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는 연말 이맘때만 되면 잊고 싶은 상처처럼 떠오르는 영화다.
프랑스 남부의 강렬한 햇살 아래, 끝없이 펼쳐진 양파밭에서 아름다운 남프랑스의 풍광과 대비되는 일곱 아이의 거친 손과 흙먼지는 핍진한 노동 현실을 보여준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인근 마을에 합법적인 아내와 또 다른 가정을 두고 있는 폭군 같은 존재로 그는 아이들을 자식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무임금 노동자로 취급하며 엄격하게 통제한다. 그는 차갑게 말한다.
"일해라. 그래야 먹고살 것 아니냐. 나한테 기대할 생각은 마라."
어머니는 남편의 폭언과 가난, 고된 노동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며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준다.
덥고 건조한 남부 프랑스에서 눈은 좀처럼 보기 힘든 현상으로 여기서 '눈'은 구원, 휴식, 혹은 현실의 고통을 덮어주는 축복을 상징한다.
1. 가부장적 권력과 ‘그림자 노동’의 경제학
영화 속 농장주인 남자는 근대적 법질서 밖에 자신만의 봉건적 영지를 구축한다.
봉건적 가부장인 아버지는 가끔씩 나타나 어머니를 데리고 2층으로 사라지거나 전기 아끼라, 음식 아끼라 잔소리하며 아이들마저 농장 일에 부려 먹는다.
그는 인근 마을에 합법적인 가정을 둔 채, 주인공 가족을 ‘비공식적 존재’로 격리한다. 사회학적으로 이는 ‘그림자 노동(Shadow Work,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이자 사회비평가인 이반 일리치(Ivan Illich)가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임금은 받지 못하는 노동)’의 극단적 형태다.
아이들은 학교 대신 밭으로 향하며, 어머니는 남편의 폭언과 노동 착취를 견디며 힘겨운 나날을 견딘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 시장에 나갔을 때, 우연히 아이들의 생부(농장주)와 그의 '가족‘을 마주치는 장면이 있다. 남자는 번듯한 옷을 입고 합법적인 아내,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또 다른 가족인 주인공들을 보고도 마치 모르는 사람인 양 차갑게 외면한다.
남자의 '진짜'(?) 가족이 사는 마을은 법과 질서, 풍요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여기서 남자는 존경받는 가장이자 시민인 반면 주인공들이 사는 농장은 현대 사회에서 격리된 '유령의 섬'과 같다. 남자는 이들을 자녀가 아닌 ‘무임금 노동력’으로 취급하며 자신의 자본을 축적한다.
이 이중적인 생활이 가능한 이유는 공동체가 이들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 남자의 사회적 위치와 권위로 묵인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주인공 가족은 사회적 안전망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공동체의 침묵 속에서 서서히 잊히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다.
2. ‘비극적 이타주의’-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야."
영화 후반부에 남편(농장주)이 떠난 후 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틈새를 옷가지와 수건으로 꼼꼼히 막고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지 않은 채 가스만 나오게 조절하고는, 잠든 아이들 곁에 눕는다.
이는 더 이상 사회로부터 어떤 구원도 기대할 수 없을 때, 아이들에게 닥칠 미래의 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비극적 이타주의’의 산물이다. 가스 밸브를 여는 그녀의 손길은 잔인한 폭력이 아니라, 지옥 같은 현실로부터 아이들을 '구출'하는 유일한 방법이 죽음뿐이라고 믿게 된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정적 동기는 따로 있었다. 자신의 큰딸을 농장주이자 아버지가 겁탈한 사건이었다. 그 남자는 농장 안의 큰딸조차 소유물로 여기고 지배욕을 충족하는 괴물이었다. 그의 농장은 폐쇄적인 공간이었고 어머니가 신고도 못 하는 것은 일곱 아이의 생존과 관련 있고 큰 딸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그녀는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현실에 절망한 것이었다.
국가도, 이웃도 돕지 않는 고립된 농장에서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동반자살뿐이었다는 사실은 보는 동안 큰 충격을 주는 한편 공감이 되었다.
어머니가 가스 냄새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중, 창밖으로 눈(Snow)이 내리기 시작하고 이를 본 어머니는 다시 일어나 창문을 열고 가스를 환기시킨다.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라는 질문에 그녀는 죽음 대신 '한 번 더 살아갈 희망' 를 선택한다.
이 장면 때문에 영화의 마지막에 내리는 눈이 더욱 아름다우면서도 차갑게 느껴졌다.
영화 속에서 인상 깊은 장면은 고된 노동 후, 어머니가 아이들을 한 명씩 정성껏 씻기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어머니는 흙먼지 묻은 아이들의 몸을 닦아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환기시킨다.
"울지 마라. 우리가 함께 있잖니. 그거면 된 거야"라는 그녀의 나직한 대사는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우리’라는 말이 가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한 국가로 확장되어갈 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는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연말연시를 맞이하면서 공동체의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영화로 기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