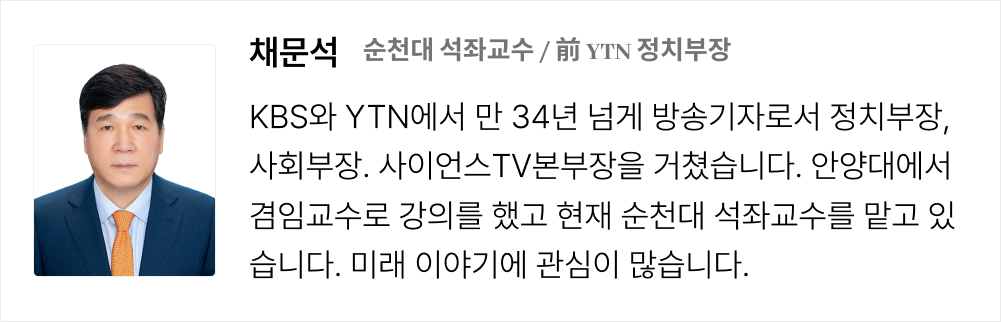손 안에 배신자를 키울 것인가?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 회사에서 한 IT 강사의 특강을 들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스마트폰이 나오면 여러분의 모든 정보가 세상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보안을 지키면 되지, 털릴 게 뭐가 있겠나’ 그렇게 가볍게 넘겼다.
그러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으면 스마트폰부터 교체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비밀번호 공개를 거부해 ‘수사 비협조’로 논란이 되는 정치인도 있다.
스마트폰이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개인의 모든 흔적을 기록하는 ‘증거의 방’이 돼버린 것이다. 국민들은 다 안다. 감추고 방해하려는 자가 범인이라는 것을...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증거의 방'
몇 년 전, 한 지상파 방송사 앵커는 불법 촬영 혐의로 체포됐다. 혐의를 부인했지만, 스마트폰 속에서 여성의 사진이 발견되며 거짓이 드러났다.
최근엔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딸의 결혼 축의금 관련 메시지를 남기다 사진 기자에게 포착됐다.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의 결혼식을 챙기지 못했다’던 해명이 무색해졌다. 그들의 손안의 기기가 결국 스스로를 고발한 것이다.
스마트폰과 연결된 미디어 환경을 보면 비슷한 사례가 넘쳐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교수 시절 SNS에서 정의로운 발언을 자주 남겼다. “대학 입시용 외고는 폐지돼야 한다.” “장학금 지급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자녀가 외고를 다녔고, 장학금도 받았다. 과거에 썼던 멋진(?) 글들이 일거에 ‘언행 불일치’의 증거로 바뀐 것이다.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최근엔 국토교통부 차관이 유튜브 인터뷰에서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서민과 청년층의 분노가 커지자 다시 유튜브에 ‘2분 사과’를 올렸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기엔 한참 부족했다. 정책 홍보라는 선의의 시도가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유튜브 영상 한 컷에 불성실함의 증거로 변한 셈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실과 각 부처 장‧차관들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려는 시도가 늘었다. 영향력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0월 2일 공개한 미디어·콘텐츠·SNS 조사에 따르면 만 13살 이상 소비자 기준 유튜브 이용률은 95%로 모든 플랫폼을 압도했다. 길이나 형식 등에 제약이 없다는 게 장점이다. 게이트 키핑 장치가 있는 레거시 미디어보다 자신을 공격하지 않은 유튜브 출연이 압박감이 덜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긴장감이 떨어지고 말이 가벼워진다. 그래서 요즘의 많은 ‘설화’가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유튜브나 개인 방송에서 생긴다. 공직자는 특히 발언의 무게를 가늠하고, 매체 선택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AI 생성 이미지 >
이쯤 되면 스마트폰은 충신일까, 배신자일까.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의 하루를 기록하는 존재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나를 무너뜨린다. “나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너, 왜 나를 배신하니?”라고 묻고 싶지만, 정작 배신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의 부주의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아날로그 충신을 추억해 본다.
정치 원로 권노갑 민주당 고문은 메모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모든 일을 머릿속에 기억해 검찰이 뒤져도 흔적이 없었다. 주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처럼 무거운 입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충신’이었다. 침묵의 정치는 아날로그 시대에나 가능했던 일이다.
언행일치와 과유불급: 배신자를 다루는 법
하지만 오늘날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손 안에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디지털 비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스마트폰을 완전히 버릴 수 없다면, 적어도 ‘언행일치’로 그 안의 기록을 당당히 마주해야 한다. 정치인은 시류에 따라 쉽게 정치 철학까지 바뀌는 ‘철새 정치’를 멈춰야 하고, 일반인 역시 SNS에서 불필요한 허세나 과장을 삼가야 한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면, 스마트폰은 언제든 그 모순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인이 된다.
스마트폰은 충실한 집사이지만 때로는 냉정한 배신자로 변할 수 있다.
당신은 오늘도 손 안에서 무언가를 스크롤하고 있다. 또 무언가를 쓰고 녹음하고 있다. 그 화면 속에서 당신은 충신을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배신자를 키우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스마트폰은 죄가 없다는 것이다. 사용자의 진실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일 뿐. 뒤늦게 “스마트폰, 너마저...” 이런 말 인용하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