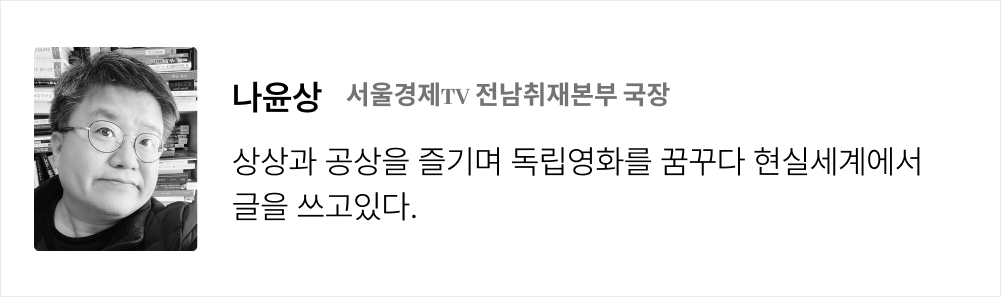[나윤상‘s 클래식] 죽음을 앞둔 이의 심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2013년 장편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의 엔딩 곡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1번’이다. 영화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낳은 정’인가 ‘기른 정’인가로 끊임없이 물으며 진행된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줄 모르고 6년을 키운 한 가정의 고뇌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묻는다. 이 칼럼이 영화가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평가나 주제의식 등을 강조하지는 않겠다.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이 영화의 주요 테마로 설정돼 중간 중간 나온다. 그 중 백미는 물론 영화가 끝나고 흘러나오는 1번이다. 영화의 여운을 이 곡 하나로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감독의 영화적 장치라 할 수 있고 이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보인다.
고레에다 감독이 이 변주곡을 영화음악으로 쓴 것은 굉장히 계획적인 선택이었다. 바흐의 이름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로 흔히 음악 수업에서 배운 ‘음악의 아버지’ (도대체 누가 그렇게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 사람이다.
1685년에 태어나서 1750년에 타계했다.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음악의 어머니’인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이다. 우습게 말하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갑인 셈이다.
바흐는 수학적 계산을 통한 음의 보편적 체계를 만들고자 했다. 그리하여 창작한 작품이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이다. 클라비어는 이후 탄생한 피아노의 조상 격인 악기다.
중세 시대는 신이 지배하던 시기였고 바흐 또한 교회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음악을 신의 언어로 생각했고 이는 인간의 언어와 다른 절대성이 있다고 믿었다.
속담에 ‘한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하지 않았던가. 바흐는 사람의 언어가 아닌 신의 언어인 음악은 글이 아닌 수로 표현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수학적 계산에 의해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이 탄생했다.
그런 바흐가 작곡한 골든베르크 변주곡도 수학적 계산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되어진 음악이다. 고레에다 감독은 바로 이 점이 영화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기존 질서(피)를 따르느냐 변주(양육)를 선택하느냐의 기로에 선 주인공의 갈등을 이 곡 하나로 정리한 셈이다.
그런데 엔딩 곡을 듣다 보면 피아노 소리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웅얼거리는 소리까지 들린다. 언뜻 불량 녹음을 갖다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정상적인 녹음이고 한 천재 피아니스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성찰한 거룩한 기록이다.
<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2013) >
영화에서 사용된 곡은 캐나다 출신의 천재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의 1981년 버전이다. 그는 1932년생으로 1955년 23세의 청년으로 이 곡을 연주해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을 경악시켰다. 이후 골드베르크 변주곡 하면 글렌 굴드로 통할 정도였고 지금도 이 곡을 듣고 싶다고 하면 애호가들은 이 피아니스트 음반을 추천한다.
하지만 글렌 굴드의 음반을 추천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두 개의 버전이 있다는 점이다. 1955년 버전과 1981년 버전이다. 한 명의 음악가가 청년 시기 해석한 바흐의 변주곡을 임종을 앞두고 전혀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마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청년 시기 세웠던 언어 철학을 나이가 들어 수정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23세 청년기의 연주는 생기 있고 발랄하고 통통 튀는 해석으로 듣다 보면 왠지 밝은 내일의 희망으로 점철되는 세상이 그려질 정도이다. 하지만 81년 버전에서는 느리고 사색적이고 깊이 있는 성찰을 요구하는 듯한 고독함의 정수를 보여준다.
그래서 혹시 글렌굴드의 변주곡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몇 년도 버전인가를 꼭 명시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글렌 굴드는 1981년 연주곡을 녹음하고 이듬해 타계했다.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연주를 듣다 보면 아등바등 살고 있는 인간사의 모든 행동이 덧없이 느껴지는 것 같다.
가을에 꼭 한 번 들어봐야 할 곡으로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