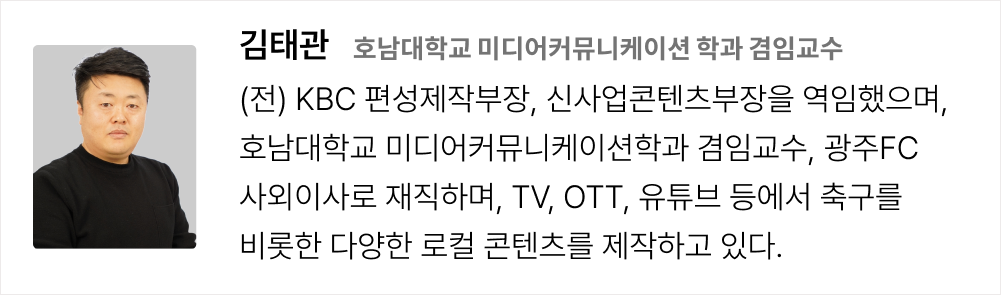[김피디의 불펀한 생각] ep.9 '백만평 광주 숲'의 꿈과 '녹지 불평등'의 그늘
< 백만평 광주숲 걷기대회 >
최근 광주에서는 군 공항 이전 부지 250만 평 중 백만 평에 '거대한 도시 숲'을 조성하자는 범시민 캠페인이 한창이다. 시민들에게는 자연을 누릴 기회를, 생물들에게는 살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자는 취지다. 지난(27일) 열린 '시민 걷기대회'에서도 수많은 시민이 함께 영산강변을 걸으며 그 염원을 공유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녹지 불평등'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우리가 마주한 녹색 불평등의 현실
광주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광주의 1인당 계획상 지정된 공원 면적(13.35㎡)에 비해 실제 이용 가능한 조성 면적은 6.37㎡로 전국 평균 이하이며, 광주 시민이 공원까지 가는 평균 거리는 2.5km, 걸어서 35분에 달한다고 한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공원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단 뜻이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한다. 북미 연구(뉴욕시 공원 정책 분석 사례)에 따르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일수록 질 좋은 공공 오픈 스페이스(녹지 공간)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거대 숲의 명암과 '녹색의 배신'
거대 공원의 기능적 효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행해진 연구에 따르면,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데는 하나의 거대한 녹지보다 여러 개의 작은 녹지를 분산 배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기도 안산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성하는 근린생활권 단위의 소규모 정원 활동이 사회적 자본 증대에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주민들 삶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한다. 반면, 공원 조성으로 주변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면, 결국 기존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오르는 집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밀려나는 '녹색의 배신'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통계로도 증명됐다. 생명의숲(2021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별 1인당 도시 숲 면적은 최대 14.3배로 격차가 벌어졌으며, 서민층 밀집 지역의 녹지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광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광주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백만평 숲'이 들어설 광산구의 생활권 공원 면적은 2.97㎢로, 동구는 0.33㎢의 9배에 달한다. 하나의 거대한 숲이 오히려 지역 간 녹지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이다.
< 미국 센트럴파크 위성 사진 >
세계는 '연결과 형평성'으로 답하다
세계적 도시들은 이미 해답을 알고 있다. 세계 최고의 공원, ‘센트럴파크’를 보유한 뉴욕시는 '공원 형평성 계획(Park Equity Plans)'을 통해 녹색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1%의 사람들에게 주목했다. 이들은 새 공원 대신 소외 지역의 낡은 공원을 재생시키고 학교 운동장 등 활용도 낮은 공간을 녹지로 전환하는 데 힘쓰고 있다. ‘환경 수도’로 불리는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도시 전체를 잇는 교통망으로 어디서든 녹지에 쉽게 접근하는 '연결을 통한 복지'를 실현했고, 베를린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한 환경 정의 지수를 활용해 녹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했다.
< 센트럴 파크 >
거대한 상징에서 모두의 숨통으로
이제, 광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천문학적인 관리비가 예상되는 또 다른 거대한 상징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모든 시민의 삶터 곳곳에 녹색 숨통을 틔워줄 것인가.
한 권역에 편중된 거대 도시 숲 대신, 도심을 관통하는 '광주천 블루-그린웨이'를 조성하고,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광주역-광주송정역 철로를 지하화해서 아이와 노인이 함께 걷는 길과 마을 텃밭으로 되살리는 '광주 그린 네트워크'를 우선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진정으로 위대한 녹색 도시는 압도적인 크기의 숲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다. 도시의 가장 소외된 골목에 사는 어르신조차 문밖을 나서면 푸른 쉼을 누릴 수 있는 도시,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도시의 미래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