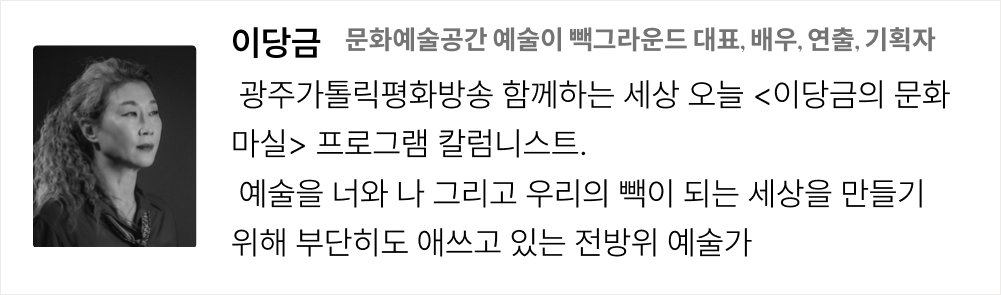‘길을 잃지 않기 위해 오늘도 걷는다 _ 까미노 데 산티아고’
알람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는 나날이다.
어느 일정 구간이 지나고 보니 알람 소리보다는 이미 체화된 습관으로 새벽 동이 틀 무렵이면 알람처럼 일어나곤 하다.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연신 몇 거품 하고, 눈을 비비고 침낭을 접고, 가방을 싸는 데까지 몇 분이면 충분하다. 커피 한잔과 간단한 빵 조각을 입에 물고 나오면 나는 거의 꼴찌 그룹에 해당한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른 새벽부터 걷고 있다. 참 부지런하기도 하다. 제법 익숙해졌다고 하지만, 걷고 걷고 걷는게 전부인 카미노 길이 간혹 지루할 때가 있다.
걷고 걷고 걷는게 전부이다 보니 그렇다. ‘아~오늘은 그냥 쨀까~ 그냥 건너뛸까~’ 뒹굴뒹굴거리며 핑곗거리를 찾는다. 걷지 않을 이유를, 가지 않아야 하는 핑곗거리를 찾아낸다. 비가 제법 내리는 날이면 더 그렇다, 비포장 길에서 달라붙은 흙이 신발에 덕지덕지 덧씌워져 하이힐 뒷굽마냥 달라붙어서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그만 걷고 싶어진다. 어플을 확인하니 숙소 마을에 도착하려면 아직 제법 멀리까지 더 걸어가야만 했다.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몸은 점점 지쳐가고 바람마저 거세었다. 안개까지 피어나더니 가시거리가 짧아졌다. 대책 없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뒤로 젖혔다. 구름 낀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다.
하늘이 너무 맑아서, 바람이 너무 좋아서, 벼룩에 물렸다고, 밤새 마신 숙취로, 다 걸으니까 나는 걷지 말자, 매일 걷는게 하루쯤 안 걷는다고 세상 바뀌나? 핑곗거리 치고는 핑계도 안되는 핑계 아닌가? 자, 보라고! 하늘이 높아 걷고, 바람이 불어 걷고, 끊임없이 펼쳐진 길이 있어서 좋고, 옆 사람이 걸으니 걷고, 앞 사람 따라 걷고, 뒷사람 따라오라고 걷고, 팀워크로 걷고, 오늘이니까 걷고, 내일이니까 걷고, 오늘 안 걸으면 내일도 핑곗거리 찾을 테니까. 이 정도면 걸을 것 같애, 안 걸을 것 같애? 오늘 하루 쉬면, 내일도 건너뛰고 싶을 거야. 한번 두번 그러다 보면 ‘세월 아 넉 달아’ 하다가 목표했던 콤뽀스텔라에는 언제 도착할래? 스스로를 다독을 빙자한 재촉으로 콤뽀스텔라를 향했다. 그렇게 길에서 길을 잃지 않기만을 바랐다.
400키로 이상을 걷다 보면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는다. 그 무엇보다 ‘가야 한다’고 재촉하지도 ‘가지 말라’고 붙잡지도 않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나의 스텝으로 걷는 것이 관건이다. 앞 사람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동료들의 스텝에 허둥지둥할 필요도 없다.
인생을 살다 보니, 까미노 데 산티아고 800키로 길의 아득함도 지루함도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전히 지금도 나는 가끔 선택의 순간을 마주한다. 그 순간마다 산티아고 800키로를 떠올린다. 지루했고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그 길, 아득히 둘러싸인 안개에 갇혀 오도 가지 못했던 그 순간의 기억과 냄새와 감각을 기억하려 한다. 눈앞이 아득할 만큼 안개가 자욱할 때면 잠시 걸음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성급히 발걸음을 떼면 보이지 않는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미 덕지덕지 붙은 흙무더기에 발목이 접질려 되려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시나브로 안개가 걷히면 앞뒤 분간이 가능해진다. 정체된 듯 보였던 시간은 좀 더 명확해진 시선으로 길을 드러낸다. 가야 할 길, 눈 앞에 펼쳐진 내 길을 걷기 위해 다시 길로 들어서면 된다. 그리고 걷는다.
오늘도 여전히 길 위에 있다.
소란했던 여름이 가는구나!
쩌렁쩌렁하던 한낮의 매미 울음소리는 사라지고 귀뚜라미가 밤새 울 모양이다.
가벼운 이불을 가슴께로 끌어당기며 발끝에 살짝 걸쳐진 이불을 두 발 사이에 꼭 끼운다.
달빛이 은은하다. 환한 달빛에 길이 멀리까지 내보인다.
잠이 잘 올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