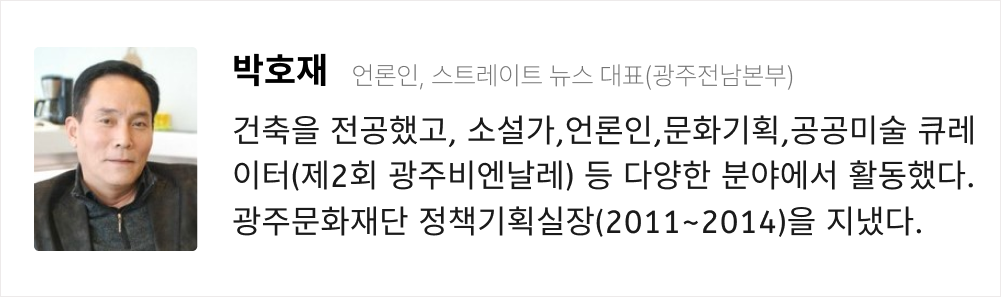우리들의 도시는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인도 주 의회의사당 (르 코르뷔지에 작품 Photo : Sanyam Bahga)
소설가로 활동했던 적이 있고, 오래도록 언론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필자가 건축과를 나와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실을 잘 모른다. 꽤나 가깝게 지내왔던 이들도 그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우연찮은 기회로 알기라도 하면 한 결같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곤 한다.
내가 그렇게 인문학적으로 보여? 그렇게 함께 웃고 넘기긴 하지만, 직설하자면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삶을 부유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어떻든 그런 이력 때문에 건축문화에 관련된 책도 펴낸 바 있고, 더러는 건축문화를 체험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강사로 나선 적도 많았다. 평소 청소년기에 체득하는 건축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강의 요청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강의에 나설 때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필자가 어김없이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다. 눈 뜨고 일어나 학교에 가고, 다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의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보는 게 무엇이죠?
건물 혹은, 집, 시가지와 같은 답변이 어렵지 않게 돌아온다. 도시가 아름다워지려면 일상의 공간에 즐비한 건축물들이 아름다워져야 한다는 논리를 설파하기 위한 필자의 전략이다. 이견도 있겠지만 여전히 필자는 그 전략에 만족하는 편이다.
유럽 국가들에선 건축문화를 가르치는 학원이나 사설 프로그램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네 학부모들이 영수학원을 선호하듯, 그들은 자녀들을 건축학원에 보낸다. 물론 창의력 신장이나 구조적 사고의 발달 등 부수적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러긴 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건축을 바라보는 남다른 인식이 길러질 것은 분명하다.
건축은 주문생산품이라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 건축가와 클라이언트가 만드는 자본과 기술의 합작품이다. 클라이언트 없이 건축은 존재할 수 없다. 브라만테나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를 불러들인 로마 주교회가 없었다면 바티칸 성당의 명성도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모든 공간이 사적으로 자본화된 도시는 건축가를 찾는 두 종류의 클라이언트로 명암이 엇갈린다. ‘아름다운 건축’을 만들어달라는 주문과 ‘한 뼘의 공간도 낭비하지 말라’는 주문이 도시공간의 표정을 결정한다.
지나치게 앞서가는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필자는 아름다운 미래도시를 위해서는 공교육과정에 건축문화사가 하나의 커리큐럼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지금의 청소년들 또한 언젠가는 클라이언트로 성장할 것이고, 건축을 가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클라이언트 없이 아름다운 도시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 건축의 지평을 연 세계적 거장 르 코르뷔지에가 했던 말이다. 내 건축정신의 정수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한 프로방스 자연 여행에서 싹텄다. 올여름 혹시 해외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