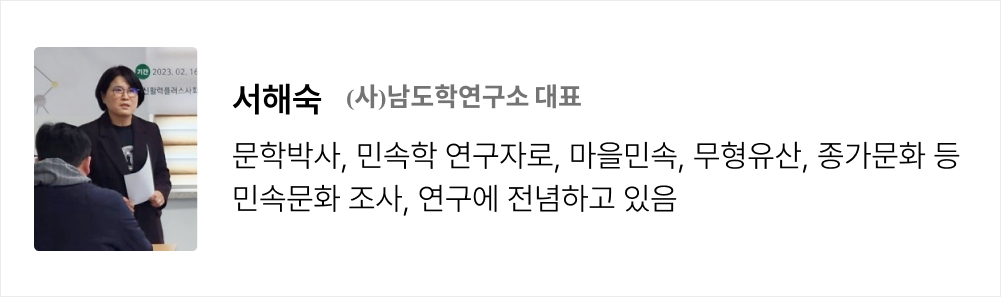우리의 제례(祭禮)는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 년 열두 달을 살아가면서 조상을 기리는 의식을 거행한다. 특별한 종교적 의미를 갖기보다는 과거 이래 조상 대대로 행한 의식이기 때문에 일 년을 주기적으로 거행한다. 우리를 이를 ‘제례’라 한다. 제례란 조상을 추모하고 유덕을 기리는 의례로서 어버이를 받들고 조상을 숭모하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다. 예기(禮記)에 ‘추양계효(追養繼孝)’라 하여 제사는 죽은 사람을 계속 공양하여 효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제사란 사후의 효라 할 수 있다. 즉 생존의 부모를 위하는 마음을 사후에까지 이어가는 것이다.
제례는 명절차례, 기제사(집안제사), 시제, 생일제사, 회갑제사 등이 있다. 오늘날에는 생일제사, 회갑제사를 모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으나 차례, 기제사, 시제는 대체로 집안이나 문중 단위로 모시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제례를 모시는 형태가 많이 변해 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모시는 조상의 대수는 4대 봉사를 기준으로 했으나 점차 3대 봉사, 2대 봉사를 하는 집안이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시제는 대개 5대조 이상부터인데, 최근에는 2대조도 시제로 모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 명절에는 차례를 모시지 않고 해외여행, 가족여행을 떠나는 일은 이제 결코 낯설지 않은 이야기가 되었다.
여기에 명절차례, 기제사, 시제 등으로 구분하여 제례의 전통과 변화상을 간단히 살펴보자.
명절차례
오늘날 차례를 지내는 명절은 설과 추석으로 집약된다. 예전에는 정월 보름과 동지에 제물을 간단히 차려 비손을 하기도 했으나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한 마을에 장손과 차손 등 자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으면, 차례를 지낼 때 그 순서가 있다. 먼저 큰집의 장손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그 다음 작은집에서 차례를 지낸다.
이때 그 밑의 손들은 모두 차례를 지내는 집으로 가서 인사를 올린다. 이렇게 차례로 각 집의 제사에 참석해야 하기에 새벽부터 제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각 집의 선영에게만 차례를 지내기에 오전에 각자의 집에서 제를 지낸다. 차례는 기제사를 모시는 봉사 대수의 선영을 한 번에 모시기에 지방을 일일이 쓰고 표시하는 집안이 있는 반면에 지방을 쓰지 않고 제를 진행하기도 한다.
설과 추석에 지내는 차례에는 선영상 외에 성주상과 삼신상을 차린다. 성주는 집안의 대표 신이기에 반드시 상을 차리지만, 삼신상은 집안에 따라 차리지 않기도 한다. 먼저 성주상을 차리고 그 다음 선영상, 삼신상을 순서대로 제물을 진설한다. 성주상에는 술을 한 잔 올린다. 성주상과 선영상의 제물의 가짓수는 동일하지만 성주상에 올린 제물의 양은 적게 차린다. 그리고 선영상에는 준비한 제물을 차례로 진설한다.
설날에는 메(*밥) 대신 떡국을 올리거나, 메와 떡국 두 가지 모두 올리는 경우가 있다. 추석에는 기제사와 동일하게 메를 올리는데, 이때는 새로 난 햇곡식으로 메를 짓는다. 선영상까지 진설되면 그 옆에 삼신상을 놓는데 미역국과 밥, 물만 놓는다. 삼신에게는 특별히 상을 두지 않고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 위에 짚을 깔고 제물을 놓는다.
제물이 진설되면 제를 진행한다. 명절 제사는 단잔단배(單盞單拜) 무축(無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집안에 따라 먼 곳에서 온 자녀가 조상에게 성의껏 잔을 올리도록 삼헌을 행하기도 한다. 잔은 여러 잔 올리지만 명절 제사에서는 축은 읽지 않는다.
기제사(忌祭祀)
사람이 죽은 날로 3년이 되면서부터 지내는 제사를 ‘기제사’라고 한다. 기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죽기 전날, 즉 마지막으로 숨이 붙어 있는 날을 제사일로 한다.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자시(子時)로 밤 12시부터 제물을 진설하여 제를 지낸다. 그리고 첫닭이 울기 전에 철상을 한다. 이는 닭이 울면 날이 새어 귀신들이 저승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자식들의 생활권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이기에, 그리고 다음 날 출근 등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앞당겨 밤 10시경에 지내거나 혹은 저녁 7~8시로 시간을 변경하여 제를 지내기도 한다.
제를 지낼 때 누구의 제사인지를 알 수 있게 지방을 쓴다. 흰 창호지를 네모로 접거나 위패 모양 등으로 접어 고인의 이름을 쓴다. 생전에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은‘學生府君’이라고 표기한다. 만약 고조부의 기제일이면 지방에 ‘顯高祖 號 본관·성公神位’라고 쓴다. 근래에 한문의 사용이 줄어 지방을 쓰는 형식을 책에서 보지 않으면 모르기에 지방을 쓰지 않고 사진을 상 위에 놓기도 한다.
기제사의 봉사 대수는 집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3대 봉사, 4대 봉사, 5대 봉사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4대 봉사를 한다. 만약 5대 봉사를 하는 집안의 경우에 아래 대수가 죽으면 6대가 되기에 그때는 시제로 올라간다. 옛날에는 봉사하는 선영 한 분 한 분의 기제사 일에 맞춰서 제를 지냈기에 종손은 일 년 동안 지내는 제사가 8번 이상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합제로 모시는 경우가 많다. 5대 내외의 선영들을 한 날로 합쳐서 지내는 제사를 ‘합제’라고 한다. 합제는 부부간만 한날로 합하여 제를 지내거나 여러 대수(代數)를 한날로 합하여 제를 지내기도 한다. 여러 대수를 한날로 합할 때는 대수가 적은 선영의 제삿날이 대수가 높은 선영보다 빠른 달[月]에 제사일이어도 대수가 높은 선영이 가장 윗 조상이기에 대수 높은 선영의 제삿날로 날을 받아서 제를 지낸다.
부부의 경우 한날로 제일을 합칠 때는 남편의 제삿날로 부인을 모셔와 지내거나 둘 중에 빠른 달[月]에 들어 있는 날로 제사를 합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제사는 달을 지나쳐서 제를 지내면 좋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다. 제사를 한날로 합칠 때는 각각의 기일에 제물을 진설하고 제를 지내면서“내년부터는 한날 합하여 몇 월 며칠에 제사를 지낼 것이니 그날 오십시오.”라고 성고를 한다. 그리고 다음 해부터 한날한시에 지방을 쓰고 제를 지낸다.
대부분의 집안에서는 제사상을 마루나 안방, 큰방의 윗목에 차린다. 먼저 배석을 까는데 왕골로 만든 것이 아닌, 띠로 짠 초석을 깐다. 그리고 병풍을 치고 상을 놓는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간소화가 되면서 배석이나 병풍을 깔거나 치지 않고 그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여 상을 놓고 제를 지내는 집이 대부분이다.
<전남보성 진원박씨 죽천(박광전)종가 불천위제례>
시제(時祭)
음력 10월에 지내는 문중 제사를 ‘시제’ 혹은 ‘시앙’, ‘묘제’, ‘묘사’라고 한다. 시제는 대부분의 문중에서 동일하게 음력 10월에 지내지만, 음력 9월부터 지내거나 혹은 양력 11월에 지내기도 한다.
시제에 올라가는 대수는 5대조 이상부터이다. 만약 5대조의 자손이 생존하였다면 종손 집에서 그 5대조 마지막 자손 집까지 장소를 옮겨서 지낸다. 그리고 그 마지막 손마저 죽으면 그때 시제로 올린다. 근래에 들어 기제사를 모시는 봉사 대수가 줄어서 4대조, 3대조까지 시제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시제에 올리는 방법은 집안에서 문중 회의를 거쳐서 올린다. 파종별로 각 제각을 지어서 그곳에 일부 금액을 내면 시제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옛날에는 집안마다 종파마다 제각을 짓는 곳이 많지가 않아서 선영이 잠들어 있는 묘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제물을 진설하고 제를 지냈다. 그러나 근래에는 제각이나 제실을 지으면서 한날한시에 날을 받아서 여러 대수의 선영들을 한자리에서 제를 지내게 되는 형식으로 공간의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옛날에는 각 선영의 묘마다 그에 딸린 전답이 있다. 이를 ‘위토답’ 또는 ‘종중답’이라고 한다. 이 전답을 연[年] 단위로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해의 제물을 장만하도록 하였다. 이들을 ‘고직이’ 또는 ‘재직이’, ‘산직이’라고 칭하였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전답을 팔아서 문중 자금으로 돌리거나 혹은 이 전답을 벌어먹을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물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집안별로 돌아가면서 음식을 장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관을 선정할 때 유사도 같이 선정한다.
이처럼 명절차례, 기제사, 시제 등은 근대화, 산업화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새마을사업 등 격변의 현대사회로 진입하면서 전통적으로 행해져 오던 제례가 점차 사라지거나 다른 양상으로 대체되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강조되는 합리적인 사고로 인해, 전통적으로 행해져 오던 일생의례의 허례의식을 줄이고 의례를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였다. 이는 제례를 악습 혹은 악풍으로 보는 사고와 관련이 있기도 하다.
그리고 제례의 변화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측면은 현대사회에 급격하게 대두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 두 사고는 집단주의, 혈연주의에 대비되면서 의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은 자율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변화하여, 자연스럽게 제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외에 과학이 발달하고 서구의 다양한 문물이 유입되면서 제례의 변화 또한 필연적으로 이루었다.
이렇듯 시대의 흐름에 따른 여러 사고와 인식의 결과로 제례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는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 원래 문화는 변화의 속성을 갖는다. 그리고 변화는 시대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를 ‘조화’라고 말하기도 한다. 흔히 과거의 전통이 사라지거나 대체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인식하지만, 전통에 담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사고한다면, 이러한 제례 양상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