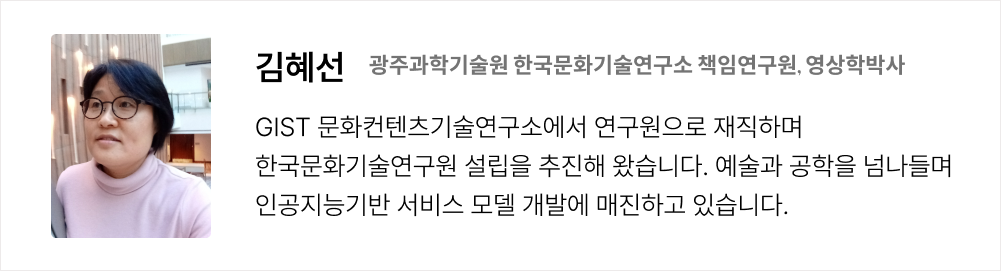[기획 칼럼] 광주비엔날레, 왜 우리는 '처음'만 기억하게 되었는가
부산비엔날레를 통해 본 구조적 문제와 재도약의 길
광주는 늘 '처음'을 만들어온 도시다.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가장 먼저 폭발했고, 1995년에는 아시아 최초의 국제비엔날레인 광주비엔날레를 탄생시켰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물론 아시아 현대미술의 미래를 상상하는 가장 실험적인 장이었다. 이어 광주국제영화제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출범하며 문화의 혁신 실험장으로서 광주의 정체성을 확인시켰다.
하지만 오늘날, 광주의 이 두 행사는 '처음'의 영광만 남은 채 제자리에 머무르거나 쇠퇴하고 있다. 반면 후발주자였던 부산은 부산비엔날레와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지역을 넘어 세계 문화도시로 도약했다. 광주는 왜 계속해서 출발선에서만 기억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광주비엔날레의 명성과 그 후퇴
광주비엔날레는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현대미술로 승화시키며, 세계적인 작가와 큐레이터가 주목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누적되었다.
첫째, 정치권의 개입과 불안정한 운영이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실질적으로 광주시장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전시 방향, 예산, 인사까지 정치적 고려가 작용해 왔다.
둘째, 기획의 연속성과 전문성 결여다. 큐레이터 선정이 정치적 타협으로 흐르거나 중도 변경되기도 하고, 장기적 기획이 부족해 비엔날레마다 정체성이 바뀌는 현상이 반복된다.
셋째, 예산 구조의 편중과 민간 참여의 부재다. 광주비엔날레는 여전히 공공예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민간 후원이나 기업 협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과적으로 전시의 질을 약화시키고 예술가와 시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부산비엔날레에서 배우는 점
부산비엔날레는 2000년 영상비엔날레를 기반으로 출범했으며, 이후 사단법인 중심의 독립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예술감독 선임은 공정한 공개 공모로 진행되며, 기획자 중심의 장기적 전략과 국제 네트워크 운영이 뚜렷하다. 부산시장은 명예직에 머무르며, 실무는 전문가에게 위임된다. 또한 민간 후원 확대와 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재정 다변화로 정치적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다졌다.
즉, 부산은 정치로부터의 독립, 예술에 대한 신뢰, 기획의 연속성, 민간의 참여라는 네 가지 기반 위에서 비엔날레를 ‘도시 브랜드’로 정착시켰다.
광주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 혁신
광주비엔날레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 정치로부터의 독립! 재단 이사장은 명예직으로 두고, 운영은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가 실질 권한을 가지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 기획의 장기 전략 수립! 큐레이터 팀이나 예술감독에게 연속적 기회를 부여해 전시 기획의 일관성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 시민과 예술가 중심의 거버넌스 확대! 지역 미술계와 청년 예술가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지역 생태계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 재정 다변화와 민간 협력 확대! 기업 후원, 국제 재단, 문화기술 기반 후원 모델을 개발하여 재정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
맺으며
광주비엔날레는 한국 현대예술의 시작을 알린 상징적 존재였다. 하지만 상징만으로는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없다.
이제는 “왜 우리가 처음이었는가?”보다 “어떻게 다시 앞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정치의 그림자를 거두고,
예술이 중심이 되는 구조를 다시 세울 때,
광주는 단지 시작한 도시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