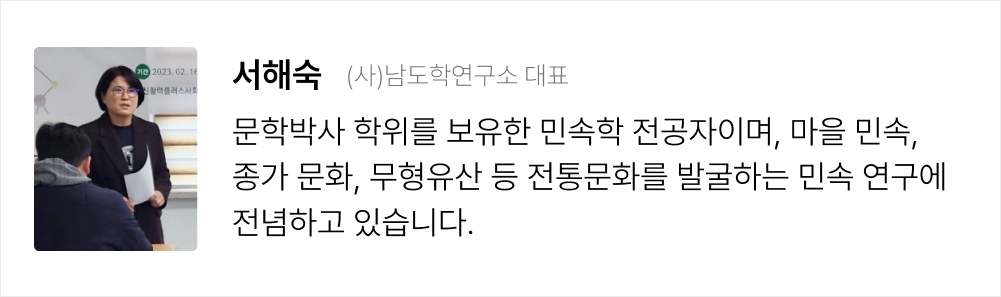나무꾼은 왜 지상으로 다시 내려왔을까?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는 단연 우리나라 최고의 환상적인 이야기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이야기는 착한 나무꾼이 사슴의 목숨을 구해주어서 그 보답으로 선녀와 결혼하고, 하늘에 올라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줄거리이다. 실제 이러한 줄거리 외에도 우리 조상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재생산하여 그 안에 꿈과 이상을 펼치기도 했는데, 하늘에 올라갔던 나무꾼이 어머니가 보고 싶어 다시 지상에 내려왔다가 금기를 어겨 다시 승천하지 못하고 죽어서 수탉이 되었다는 비극적인 결말의 이야기가 그 중 대표적이라 할만하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전해오는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남녀가 결혼하여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가 일반인들에게 더 많이 알려진 듯하다.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는 이야기에 따라서 행복한 결혼, 불행한 이별 등으로 그려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남녀의 결혼과 시련에 관한 이야기가 구체적이면서도 전국적으로 전해오고 있다는 점은 문학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다가 이광수의 「금강산유기」에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금강산유기」는 1922년 3월~8월까지 「新生活」에 발표한 기행수필로, 1923년 신문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하였고, 1979년 「이광수문학전집」9에 수록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이야기는 기본 줄거리는 유사하지만, 나무꾼이 사슴의 지시에 따라 선녀를 만나러 가는 대신에 사슴이 직접 나무꾼을 팔담으로 이끌고 간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나무꾼의 승천으로 보통 마무리되는데, 여기에서는 백중비가 내리는 연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다.
이렇게 「금강산유기」에 실린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는 1928년에 발간한 최남선의 「금강예찬」에 수록된 내용과도 유사하다. 다만 여기에서는 나무꾼 대신에 사냥꾼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사슴이 사냥꾼에게 목숨을 구해준 보은으로 선녀에게 장가가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자식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후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1940년 발간)에 수록된 <선녀의 옷과 수탉>는 나무꾼이 선녀와 승천한 이야기는 유사하지만, 뒷부분에서 승천한 아들이 어머니를 보기 위해 지상에 내려왔으나 어머니가 끓인 죽을 먹다가 용마에서 떨어지면서 다시 승천하지 못한 채 죽어서 수탉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끝맺는다.
대개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되지만, <선녀의 옷과 수탉> 이야기는 서사구조가 훨씬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결말이 비극적이다. 그리고 나무꾼이 어머니를 뵈러 다시 지상으로 내려올 때 타고 오는 ‘용마’와 죽은 나무꾼이 화신한 ‘수탉’이 등장하는 점이 다르다.
이처럼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는 나무꾼과 선녀가 중심이 되어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결말이 파생되었고, 이에 따라 강조하는 바도 다르다. 사슴은 나무꾼과 선녀가 만날 수 있도록 조력자로 등장하고, 그리하여 두 사람이 결합하여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선녀가 승천하고, 이후 나무꾼이 승천하는 등등 다양한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것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다양하듯 그들의 인식과 표상 역시 다양함을 의미한다.
사람은 문화를 영위하면서부터 다른 동물과 구별되었는데, 그 문화의 기저에는 ‘가족’이라는 사회적 공동체가 자리하고 있다. 가족은 집이라는 공간을 토대로 이루어지므로 한 사회를 인식할 수 있는 축약된 단위이고, 문화적 전통을 잇는 최소 사회집단이다. 따라서 가족을 매개로 마을이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되며 나아가 국가를 이루고 있음을 염두한다면, 가족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전통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첩경이 된다.
나무꾼은 금강산이란 외딴 산골을 배경으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거나 고아로 친척 집이나 남의 집에 얹혀사는 외로운 총각으로 묘사된다. 게다가 서른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는 노총각 신세이면서 머슴살이나 나무꾼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가난하고 미천한 처지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나무꾼은 아내와 자식 등의 가족관계, 재산, 신분 등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갖지 못한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나무꾼의 모습은 현실세계인 지상에서는 어느 것 하나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사슴을 구해주는 동물 보은을 통해 천상계의 선녀를 만나게 되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선녀의 날개옷을 훔치는 ‘속임수’를 통해 결혼하여 가족을 이루게 된다. 지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환상적인 천상의 세계가 개입되면서 나무꾼의 꿈은 실현된다. 비록 비정상적인 방법이지만….
이렇게 나무꾼이 꾸린 가족은 시어머니, 남편, 자식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직계가족의 모습이다. 나무꾼이 선녀옷을 훔친 것은 결국 가족을 꾸리기 위한 열망의 결과이다. 이후 선녀가 옷을 되찾아 천상으로 올라가 잠시 헤어지지만, 나무꾼이 기어이 두레박을 타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역시 가족에 대한 열망의 지속적인 표출인 것이다.
그러나 나무꾼에게 어머니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는 가족 구성원 중의 하나이다. 어머니를 지상에 놔두고 혼자서 아내와 자식을 따라 천상으로 간 나무꾼에게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중요한 갈등과 번민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다시 나무꾼은 지상으로 돌아가지만, 어머니가 끓여 준 죽을 먹다가 ‘금기’를 어기는 바람에 더 이상 천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결국 나무꾼은 지상의 어머니와 천상의 아내, 자식들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지상에 남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어서 수탉이 되어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볼 뿐이다. 나무꾼이 아내가 아닌 어머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人倫’에 대한 행위의 결과이다. 미천한 나무꾼에게도 요구하는 윤리라고나 할까? 어찌 보면 유교적 관념이 팽배한 전통사회에서 인륜 가운데서도 특히 백행의 근본인‘효’를 중시하는 사회적 이념을 전제하면, 당연한 이야기의 결말인 것이다.
나무꾼은 선녀와 달리 지상계의 사람이므로, 당연히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사회적 통념을 따라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무꾼이 죽어 수탉이 되었다는 점은 천상계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아쉬움 등을 집약한 것일게다. 닭은 날개가 있으나 날지 못한 동물임을 생각한다면 나무꾼은 날개가 있어도 어머니로 인해 날지 못하는 수탉과 너무나 닮아 있다.
이야기가 당시 민중의 집단적 정서를 반영하는 문학임을 환기할 때, 이러한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는 통념으로 자리 잡은 전통사회의 가족에 대한 면모와 가족제도에 내재된 집단적인 정서, 갈등을 함축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