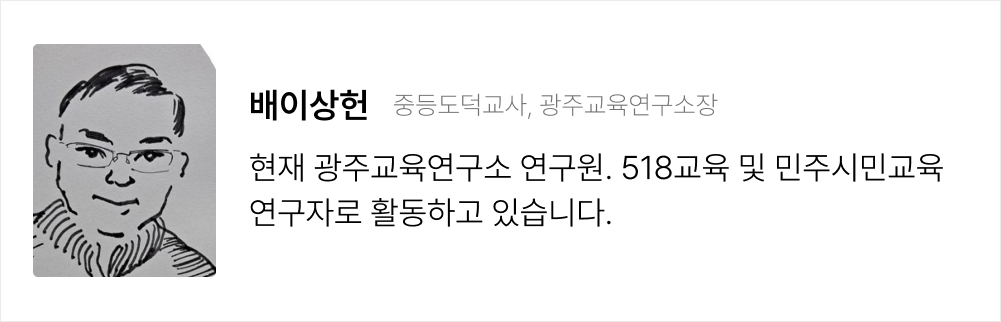5·18의 딜레마, 5·18 구묘역 광주시립공원묘지 3묘역
다시 5.18. 이제 45주년, 한 세대가 바뀌고 그다음 세대가 차오를 시간.
내가 교직을 시작했던 해, 일기나 편지 끝에 연월일을 표기할 때면 ‘분단 45년00월00일’이라고 또박또박 적었는데 한참 통일운동이 꽃피던 시절이었다.
당시 27세의 나이에 45년 전이란 까마득하기만 했는데, 근데 이제 고2 때 겪은 5·18이 그리되었네. 80년부터 치자면 46년이려나. 하~아.
이맘때면 전국의 시민들이 광주를 찾는다. 노동자들, 학생들, 시민단체 그리고 전국의 민주시민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리곤 정치인들도 빠짐없이 찾더라. 엊그젠 국힘당 친윤들이 자당의 바지사장 후보1순위로 선망한 한덕수가 5·18국립묘역을 찾아갔다가 시민들의 저지로 인해 참배를 못 하고 돌아갔다지.
헌법전문에만 실리지 못하였을 뿐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선거 출사표로 으레 5·18묘역을 찾곤 하지만 가끔씩 참배를 거부당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그들은 과연 누구이며 왜 거부당하는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싣겠다고 공약했던 두 대통령이 있었다. 시민들은 진심일지나 무능한 정치를 지켜보았고, 다른 한편으론 거짓일망정 혹시나 했다가 헛물만 켰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면 으레 참배한다는 묘역이지만 헌법전문에는 담지 못하는 5·18의 위상은 무엇일까? 자력처럼 끌려가서 자장에 흡수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강한 반발로 튕겨져 나오는 5·18묘역의 마술, 거기엔 어쩌면 꼬이고 꼬인 현대 한국 정치의 모순들이 살아 숨 쉬고 있을 게다.
5.18과 관련하여 난해한 딜레마이면서도 딱 잘라 정리하지 못한 채로 익숙해진 것들은 곳곳에 있다. 사실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공식명칭도 그렇다.
1980년 5월 당시 전두환과 신군부 쿠데타 음모에 의한 과잉진압 그 이상의 ‘학살’에 맞서서 살아남고자 시민들이 뭉쳐 항쟁한 것을 1997년 김영삼 정부가 ‘5·18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한 것 아닌가.
대한민국 정부는 5·18에게 ‘민주화운동’이라는 옷을 엉거주춤 입히면서 광주시가 처음 요청한 ‘5·18 민중항쟁 기념일’의 ‘항쟁’이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질문을 감추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군부 파시즘의 계승자들은 사실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 폭력을 감추고 싶었던 것이고, 생존을 위해 총기를 들고 무장하기까지에 이른 시민 항쟁을 두려워하며 숨겼다. 그것은 정확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집권자들의 적극적 선택으로서, 인정하고 위로하는 등 후퇴한 척하면서 사실은 실리를 챙긴 정치였다.
그런데 45년이 지나도 민주화운동이라니. 도대체 언제까지 민주화운동이어야 하나. 옷은 예쁜 것 같지만 사실은 사춘기 청소년에게 초등생 옷을 입혀놓은 꼴 아닌가. 여타의 민주화운동처럼 폄하한 채로 과연 헌법전문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걸까? 아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포기한 대가로 헌법전문에 5·18을 담겠다고 할까 봐서 두렵기만 하다.
어쩌면 일부 정치인들은 ‘민주화운동’이니까 꺼림칙한 5·18묘역을 드나들 수 있는 건지도 모른다. ‘민중항쟁’이라면 그들 중 일부는 참지 못하고 북한군 공작설 같은 대표적 왜곡을 자신의 입으로 실토할지도 모른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파시즘과 민주화 세력의 공존을 위한 거래 차원에서 만들어진 ‘민주화운동’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건가?
5·18의 딜레마 중 가장 대표적인 딜레마는 망월묘역이라고 불리는 광주시립공원묘지 제3 묘역과 5·18국립묘역이 공존하는 현실이다. 통상 전자를 5·18구묘역이라 칭하는데, 1980년 5월 29일 광주시가 126기의 관을 이곳에 가져다 놓은 것에서 5·18망월묘역이 시작된 것이고 1997년 현재의 국립묘역으로 이장한 후에 5·18 당시 희생자 142기가 가묘(假墓)형태로 존속하고 있다.
현재 이곳은 망월 민족민주열사 묘역으로 불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앱도 그와 같은 명칭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그렇게 명명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근거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곳은 그저 광주시립 공원묘지 3묘역일 뿐으로 묘역의 절반 이상은 일반인들의 묘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통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서 붙여진 이름이라면 어쩌면 가장 적합한 명명일지도 모르겠다.
1987년 이한열 열사가 100만 인파의 애도를 받으며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와 이곳에 안장된 것을 시작으로 이후 박선영, 표정두, 조성만, 김종태, 홍기일, 박승희 열사 등의 민주화운동의 주요 열사들이 이곳을 죽음 너머 최후의 안식처로 삼았다.
이분들이 3묘역을 선택한 것은 우연적인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5·18 영령들과 함께하겠다는 것이며 그들의 마지막 죽음의 사연도 5·18의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을 묻는 절규였다.
이렇듯 민주열사들의 소식을 들으며 가장 슬프고 아팠던 것은 누구보다도 5·18유족들이었다. 5공화국 전두환 정권의 가증스런 폭압 속에서 철저히 외면되고 고립되었던 유족들에게 5월의 진실을 만천하에 요구하며 죽어갔던 열사들이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을까. 어쩌면 가족보다 더욱 귀한 가족이었으리라.
그래서도 1997년 5월 새로 완성된 국가 묘역으로 이장할 때 5·18유족들의 마음은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민주열사들을 여전히 극렬 좌경 빨갱이 취급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내버려둔 채로 5·18희생자들만 국가의 묘역으로 옮긴다는 것이 못내 미안하고 도리가 아닌 것 같았다. 유족회는 수차 토론을 진행했다.
권력의 회유책에 말려드는 것 아닌지를 우려하며 그대로 남아 이후 민주열사와 함께 옮겨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17년 동안 싸워 얻은 성과를 원칙에 맞지않다고 막연히 거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 생각하면서 결국은 국가묘역으로 모두 이장하였다.
그래서 결국 지금처럼 국립5·18묘역과 5·18열사의 가묘를 품은 민주열사묘역이라는 두 개의 묘역이 긴장하며 공존하고 있다. 민주열사묘역은 5·18열사들을 부활시키는 진상규명 투쟁의 도도한 흐름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다. 142개의 가묘와 함께하는 민주열사 묘지는 국립묘역이 만들어지까지 지난한 투쟁과 여전히 끝나지 않은 5·18의 앞으로 달려 나갈 정의가 무엇인가를 쉼 없이 호흡하며 질문하고 있다.
두 개의 묘역이 공존하지 않았다면 국립묘역은 어쩌면 파시즘의 전리품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국립묘역은 5.18의 화석화, 박제화로 곤두박질했을지도 모른다. 두 개의 묘역, 그것은 현재가 과거를 구원하며, 과거가 현재를 구원하는 역사의 합주를 연출하고 있다. 딜레마를 떨치는 것, 그것은 5·18묘역을 살아있는 역사의 진원지로 가꾸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