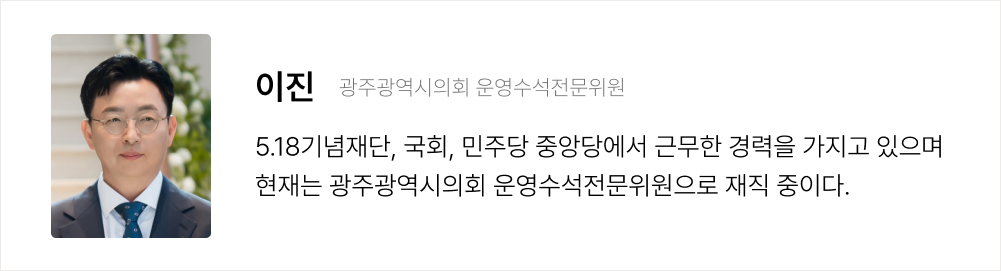[만주에서 보낸 여름휴가 3편] 연길감옥항일투쟁기념비(延吉監獄抗日鬪爭紀念碑)
연길감옥은 무장독립전쟁 당시 중국 북동부에서 유일하게 탈옥에 성공한 곳
1931년 7월 29일 자 ‘동아일보’는 ‘연길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렸다. 제목은 ‘전염병이 창궐: 면회하려 갓섯든 안해가 시체된 남변을 차저가’다. 연변지구 화룡현(和龍縣)에서 오창묵이라는 젊은이가 항일투쟁을 벌였다. 그러다 연길감옥에 투옥됐다. 감옥에 장티푸스가 창궐했다.
그는 1주일간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앓다가 숨을 거두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아내가 음식을 마련해 면회를 왔다. 시체를 찾아가라는 당국의 통보를 받고 풀썩 주저앉아 3시간 동안 대성통곡했다. 주변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감옥에서 순국한 선열들을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들은 살이 찢기고 손발톱이 뽑혀 나가면서도, 온갖 고문과 회유에 굴하지 않았다. 끝까지 조국을 버리지 않았다.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항쟁은 신념을 지키는 일이었다. 연길감옥투쟁은 전혀 예외적인 항쟁이다.
연길감옥 옛터(현재 연변예술극장),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용정시 용정로 2755호에 위치하고 있다.
연길감옥은 무장독립전쟁 당시 중국 북동부에서 유일하게 탈옥에 성공한 곳이며, 중국 마지막 황후이자 만주국 황후인 완롱(婉容)이 41세의 나이로 병사한 곳이기도 하다. ‘연길감옥항일투쟁기념비’에 참배하러 갔다. ‘연길감옥항일투쟁’, 처음 접한 사건이었다.
1931년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연길에 항일유격대가 조직됐다. 무명의 항일 투사들이 사살되거나 체포됐다.
1930년대 초 1천 명이 넘는 항일투사들이 연길감옥에 투옥됐다. 이 중 중국공산당 왕청현(汪淸縣) 초대 서기 김훈(金勳, 1904~1934)은 감옥위원회를 조직하여 파옥(破獄)투쟁을 계획했다. 김훈은 연길 명동촌의 가난한 농민가정 출신이다.
대성중학교와 영신중학교를 다녔다. 그곳에서 비밀혁명단체에서 활동했다. 1930년 5월 샤오황구(小荒沟), 산차커우(三岔口) 등에서 ‘적색 5월 투쟁’[을 이끌었다. 1931년 12월 체포돼 연길감옥에 수감됐다. 김훈의 두 차례 파옥을 계획했지만 변절자에 의해 실패했다.
1934년 12월 16일 한겨울, 일본군은 부르하통하(布尔哈通河)에 다리(현재 연길대교)를 건립할 때, 김훈을 얼음판에 밀어 넣어 익사시켰다. 범도루트의 방현석은 연길대교를 건널 때 김훈의 죽음에 대해 목놓아 외쳤다.
김훈과 함께 활동했던 감옥위원회 간부들도 하나둘씩 죽임을 당했다. 엄혹한 상황에서 김훈의 뜻을 이은 이진(李進, 1906~1931)은 ‘연길감옥가(延吉監獄歌)’를 만들었다. 그는 처형장으로 걸어가는 동안에도 연길감옥가를 불렀다고 전해진다. 25세에 순절했다. 감옥 동지들은 7절까지 투쟁의 노래를 완성했다.
연길감옥가
바람 세찬 남북 만주 광막한 들에 붉은 기에 폭탄 차고 싸우던 몸이
연길 감옥 갇힌 뒤에 몸은 시들어도 혁명으로 끓는 피야 어찌 식으랴
간수놈의 볼멘소리 높아만 가고 때마다 먹는 밥은 수수밥이라
밤마다 새우잠에 그리운 꿈에 내 사람 여러 동지 안녕하신가
기다리던 면회기가 돌아오면 슬프도다 그물 속의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치는 눈물뿐일세 간수놈이 가라 하니 서러운 눈물
금전에 눈 어둡고 권리에 목맨 군벌들과 추수뱅이 아편쟁이들
꿈속의 잡소리로 무리한 판결 청춘을 옥중에서 시들게 한다
너희는 짐승같은 강도놈이다 우리는 평화사회 찾는 혁명군
정의의 칼은 용서 없나니 정당히 판결하라 죄인이 누구냐를
팔다리에 족쇄 차고 자유 잃은 몸 너희놈들 호령에 굴복할소냐
오늘 비록 놈들에게 유린당하나 다음날엔 우리들이 사회의 주인
일제놈과 주구들아 안심 말어라 70만리 넓은 들에 적기 날리고
4억만의 항일 대중 돌격 소리에 열린다 감옥 문이 자유세계로
1935년 6월 7일, 단옷날이었다. 김명주(金明柱, 1912~1969)를 비롯한 17명의 결사대는 파옥투쟁을 결행했다. 300여 명이 탈옥했다. 쫓고 쫓기는 과정에서 49명이 살아남았다. 그들은 안도현의 동북인민혁명군에 가담해 항일전쟁을 이어갔다. 김명주는 함경북도 농민 가문 출신이다. 부모님을 따라 연길로 왔다. 1930년대 농민회에 가입, 임대료와 이자 감면을 촉진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공산주의 청년단에 가입했다.
그해 10월, 지주의 집과 곡식더미에 방화한 혐의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아 연길감옥에 수감됐다. 김훈 등이 살해된 후 교도소 투쟁을 이끄는 책임자였다. 이후 항일연합군 제2군 제2사단(후에 제6사단으로 변경)에서 분대장과 소대장을 역임했다. 1937년 7월에 중국공산당에 입당했다. 이후 독립 제4사단 전투참모장, 연변 특별구 무장부 부장, 국가 민정부 부장, 국가 검사소 감독관을 역임했다. 1969년 8월 연길에서 병사했다.

이 비는 2000년 6월 김훈, 이진, 김명주 등 감옥위원회 후손들이 발의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정부가 후원해 ‘기념비’를 건립했다. 투쟁비의 측면에는 ‘金明柱 家屬 敬捐’이라고 쓰여 있다. 김명주의 부인 서순옥과 딸 김진옥이 앞장섰다고 한다.
주변에는 투쟁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설명하는 안내판도 있었고, 깔끔하게 조성된 공원에서 중국인들은 광장무를 즐기고 있었다.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 기념비의 뒷면이 모두 지워졌다. 과거 자료를 찾아봤다. 한글과 중문으로 사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기단 아래쪽엔 한글로 ‘연길감옥가’가 새겨져 있었다. 어떤 연유로 지워졌는지 알 수 없다. 현재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을 보면 한글은 없애고 중국인의 항일역사로 채울 것 같다. 합리적 의심이 들었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한국말로 기념비를 설명하고 있었다. ‘만주로드’였다. 범도루트 참가자 중 퇴직교사가 있었는데 만주로드 운영자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었다. 좋은 스승과 훌륭한 제자의 만남을 보면서 ‘신대한의 독립군의 백만용사여! 조국의 부르심을 누가 아는가’ 독립군가가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