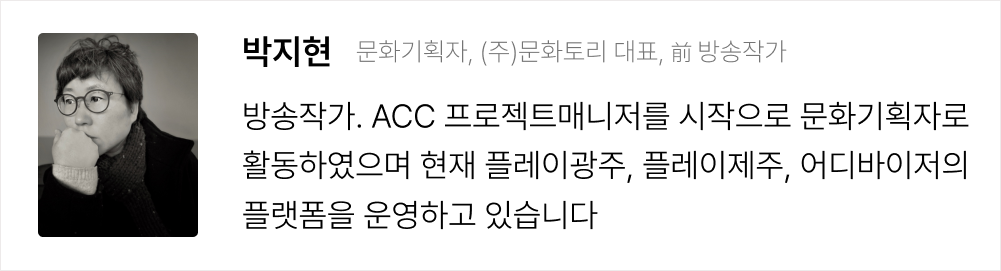[세상유감] 쑥 이야기
울 엄마 여고 시절의 이야기다.
교복을 단정히 입고 학교 가는 길, 동네 머스마들이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린단다.
“응례야”
뒤돌아보면 얼굴을 확인하곤 낄낄거리며 하는 말이 “야 복례다 복례.... 복례야 복례야”
‘응례’나 ‘응자’나 ‘응순 ‘응숙’이라고 부르면 ‘나를 부르나?’ 동네 여자아이의 반 이상은 뒤를 돌아보았다고 하니 덕례, 순자, 점순, 정숙 같은 이름이 그만큼 흔했다.
심지어 “쑥아”라고 불러도 숙자 돌림은 모두 고개를 돌렸다.
“왜 불러?”
“안 불렀는데? 여기 쑥 보고 말한 건데?”
동네 머슴애들의 장난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던 것은 그만큼 ‘숙’도 ‘쑥’도 흔했다.
그러고 보면 쑥은 우리 어머니들을 닮았다.
사회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배웠다. 영웅이 대접받는 시대인 것이다.
하지만 숙자, 자자, 례자, 우리 어머니들은 그들만의 평범한 일상을 일궜다.
살림을 일구고 자식새끼 입에 먹을 것 넣어주며 웃음꽃을 피웠다.
자식들은 그 사랑을 먹은 힘으로 미래 시대를 살아갈 힘을 얻었고 그 주역이 되었다. 그게 쑥처럼 흔한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다.
생각해 보니 단군신화의 마늘과 쑥의 설화가 가르친 것은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곰을 사람으로 만든 것의 정체는 흔하디흔한 쑥이었다.
평범함 속에 비범함? 뭐 그런?
<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쑥쑥 자라서 쑥이라던가? 쑥은 전국의 산야나 길섶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다년초다.
그러나 우리에겐 중요한 약재이자 훌륭한 식재료가 되어 주었다.
‘쑥버무리, 쑥경단, 쑥설기, 망개떡, 쑥 전, 쑥국, 쑥차’ 등 아마 이보다 더 많고 다양한 방법의 먹을 것들이 있겠지만 내가 만들고 먹어 본 것만 열거해도 이 정도다. 먹을 것뿐인가. 한여름엔 모깃불로, 한방에선 훌륭한 뜸 재료이다.
그래서 쑥은 애(艾), 봉(蓬), 애호(艾蒿), 봉애(蓬艾), 구초(灸草), 의초(醫草) 등 여러 가지 이름을 얻었다. 한자 애(艾)는 풀 초'(艸) 밑에 ‘벤다.’, ‘자른다’라는 뜻을 지닌 예(乂)로 이루어진 글자이다. ‘병을 베서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다.
중국의 어느 지방에 얼굴색은 마치 생강같이 노랗고, 눈은 쑥 들어가고, 비쩍 마른 한 병자가 명의 화타를 찾아왔다.
"의원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화타가 보니 그는 누가 봐도 황달이었다.
“황달을 치료하는 의원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환자를 돌려보내고 반년이 지난 어느 날, 화타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황달에 걸렸던 병자를 다시 만났다.
그 병자의 병이 다 나아 있었다. 화타가 놀라서 물었다.
"당신의 병을 어느 의원이 치료했습니까? 저도 그에게서 의술을 배워야겠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의원을 찾아간 일도 약을 먹은 적도,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을 한다. 오로지 먹은 거라곤 양식이 떨어져 먹은 풀이 전부였다.
"맞다! 바로 그겁니다. 저에게 알려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어떤 풀을 먹었고, 또 얼마나 먹었는지?"
"이름은 모르지만, 대충 한 달 가까이 먹었습니다."
그 풀이 바로 쑥, 그중에서 인진쑥이었다.
화타는 돌아가 당장 황달에 걸린 환자에게 쑥을 복용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효과가 없었다.
화타는 다시 병이 나은 환자를 찾아간다.
"당신은 언제 쑥을 먹었지요?"
"음력 3월경이지요."
이듬해 춘삼월, 화타는 쑥을 뜯어 다시 황달 환자에게 복용시킨다.
환자의 병이 점점 호전된다. 하지만 그 이후의 쑥은 아무런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화타는 연이은 실험으로 쑥의 새싹이 황달을 치료하는 약이 된다는 결과를 얻는다.
화타는 사람들에게 이를 구별시키기 위하여 새싹의 잎을 <인진(茵蔯)>이라 이름 지었다. 그리고 화타는 이런 시를 지었다.
三月的蓬叫茵蔯 삼월적봉규인진
四月生的只是蓬 사월생적지시봉
希望後人要牢記 희망후인요뢰기
三月的茵蔯能治病 삼월적인진능치병
四月的蓬只能當柴燒 사월적봉지능당시소
삼월의 쑥은 인진이라 부르고,
사월에 생긴 것은 쑥이다.
후세 사람들은 꼭 기억하길 바란다.
삼월의 인진은 병을 치료하지만,
사월의 쑥은 단지 불쏘시개감이다.
‘초여름 이후 쑥은 먹지 말라’고 한다. 바로 ‘독성이 강해지니 먹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 독성 역시 강한 살균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전 마을의 우물을 청소할 때 우물 안에다 쑥을 태워 연기를 오랫동안 피우는데 바로 쑥의 살충력과 살균력을 이용한 것이었다.
나 역시 오래된 한옥 한 채를 작업실로 고치면서 공사 내내 쑥불을 피웠던 적이 있다. 공사 해 주신 현장 감독님의 아이디어였는데 그때만 해도 집안의 묵은내를 없애기 위한 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들으니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벌레들을 나오게 하거나 죽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뭐니 뭐니 해도 쑥은 먹을 것들의 대명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화를 통해 단군 시대부터라는 것을 확인했으니 나라의 태동과 함께 한 식물이다.
송나라의 기록을 보면 ‘고려에서는 3월 삼짇날에 쑥떡을 먹는다.’라는 것으로 보아 우리의 전통 음식으로 자리 잡은 것은 분명하다.
쑥은 ‘애 쑥국에 산촌 처자 속살 찐다.’라는 속담처럼 쑥은 봄 먹을거리 없던 시절의 구황식물이었다. 찌고 지지고 끓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먹으며 굶주림을 이겨내었다.
< 오늘 아침 마당에서 발견한 쑥 >
쑥과에 속하는 식물을 지칭하는 학명 아르테미시아(Artemisia)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왕 아르테미스(Artemis)에서 유래한다. 아르테미스는 신선한 이슬로 식물들의 원기를 북돋아 주고 그녀의 쌍둥이 형제인 태양의 신 아폴로는 햇빛을 내려준다. 이 쌍둥이 형제는 식물의 성장과 안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는 처녀성과 월경 출산 등을 관장하는 여성들의 수호신이다.
그래서 아르테미스와 관련된 식물들은 여성들의 건강과 관련이 높다고 한다.
쑥이 부인병에 좋은 것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이다.
오늘도 쑥이 쑥쑥 올라온다.
탄핵만 되고 나면 내 속병이 쑤욱 내려갈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뉴스만 보면 다시 분노가 쑥쑥 올라오는 건, 도인이 되지 못한 탓인지, 아니면 꽃말이 ‘평안’이라는, 쑥을 먹지 못한 탓인지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