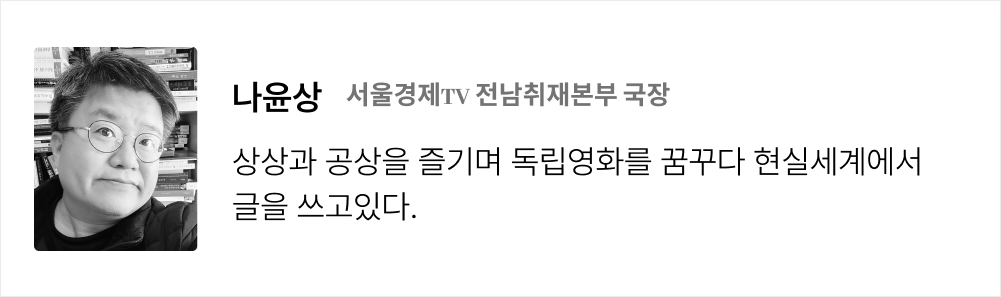[나윤상‘s 클래식] 그렇다면 발레는 어떻습니까?
< 1976년 10월에 창단된 광주시립발레단 >
“그렇다면 발레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 하면 혹자는 욕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광주는 무심하다.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혹독할 정도로 무심하다. 물론 필자의 편협한 생각일 뿐이다.
어느 날 한 기업인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돈다.
“서울, 경기는 접어두고 경상도와도 너무 차이가 크게 납니다”
평소 과장된 표현을 하지 않은 그였지만 이 말을 하면서 취했던 몸짓과 그 뒤에 잇따른 부사의 압박은 상당했다.
“아, 그렇던가요?”
“네.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너무 커요. 말로 설명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요”
다시 한번 강조해도 될까? 광주는 무심하다. 아니, 무심한 것을 넘어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닐까?
위 이야기는 경제 이야기는 물론 아니다. 문화와 예술에 관한 이야기다. 그가 뒤이어 이야기한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문화⋅예술 분야 면에서 광주는 잊혀진 도시가 돼 가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는 문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이미 어디에서부터 치료를 해야 할 줄 모르는 병상 위의 링거 약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증 환자의 모습이다는 것이다.
‘‘예향(藝鄕)’ 우리 광주는 예술의 고장이라 해서 예향(藝鄕)이라고 해요‘ 광주시 어린이시청 홈페이지에 나오는 문구다.
80년대 호남은 다 쓰러져 갈 것 같은 음식점, 다방을 가도 동양화 몇 점씩은 걸려있었다. 한국화의 허백련, 서양화의 오지호, 시인 박용철... 물론 훌륭한 예인들이었고 존경받을 분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들이 최선일까?
21세기가 25년이 지나가는 동안 인구 140만의 도시 광주와 전남은 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호남은 더 이상 예향의 도시가 아니다. 문화의 도시도 아니다.
미래 먹거리 문화인 클래식은 강원도, 경남에 뺏긴 지 오래다. 오페라와 뮤지컬은 대구, 영화는 부산이 이미 독식했다. 강원도는 매년 여름 대관령 축제, 통영은 국제음악회, 대구는 오페라 하우스를 근거로 오페라⋅뮤지컬 축제가 열린다. 국제부산영화제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국악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이가 있겠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는 독자 중 얼마 전 광주에서 열린 임방울 국악대전에 관심 가진 이가 몇이나 될까? 물론 최근 시립창극단 ‘애춘향’을 본 후로는 가능성을 보기도 했지만, 전국적 이슈로 부풀리기에는 갈 길은 요원하지 않을까?
하지만 틈새시장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문제는 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에 달렸지만...
그래서 생각해봤다. 발레라면 어떨까? 광주가 발레를 기점으로 문화의 물꼬를 트면 어떨는지.
광주는 올해로 창단 49년을 맞이한 시립발레단이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최태지 전 국립발레단 단장이 제6대 예술감독으로 취임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는 박경숙 예술감독이 이끌고 있다.
발레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예술이다는 장점이 있다. 엄숙한 매너로 유명한 클래식 연주회가 미취학 아동을 대동하지 못하는 규정과 달리 발레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 또, 공연 내내 조용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신나게 떠들고 흥분하고 박수치고 할수록 공연의 분위기는 고조된다.
발레는 또한 아름다운 신체의 언어로 감당키 힘든 감동을 선사한다. 지젤의 2막에서 나오는 24명의 빌리들의 춤, 라바야데르의 32명의 군무인 ‘망령의 왕국’, 백조의 호수의 백조들의 군무, 호두까기 인형 1막 마지막 장면인 클라라와 호두까기 왕자가 눈송이 요정들과 함께 눈의 나라로 가는 장면은 아이들에게 평생 잊히지 않은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최대의 발레 축제가 있다. 물론 서울에서 열린다. 바로 대한민국 발레축제다. 올해 15회 대회가 개최됐다. 이 축제를 광주에서 하면 안 될까? 예술 행정을 모르는 문외한 한 사람의 일장춘몽일까?
사실, 발레가 아닌들 어떻겠는가? 다만, 이대로 사그라드는 호남의 예술혼은 아쉽다.
다시 예향의 지위를 되찾기 위한 광주의 노력은 정녕 요원한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