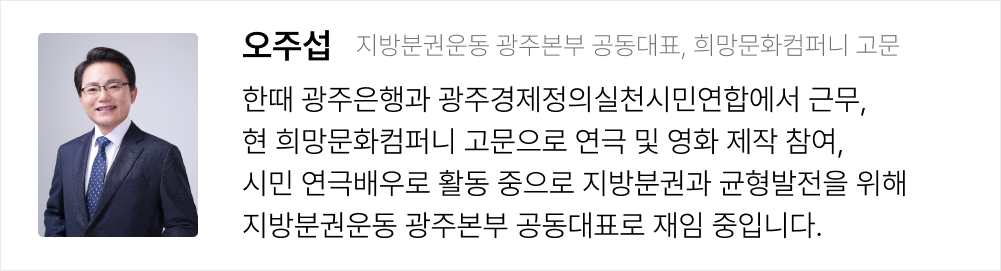추억은 사랑을 싣고....
1974년,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아버지께서 누나와 형, 나를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광주로 전학시켜 놨응게 갈 준비를 해라”.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다. 큰집 사촌 누나 결혼식 때 딱 한 번 가본 곳을 어느 날 갑자기 가서 살으라고하니 두려움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밀려왔다.
6형제 중 큰형은 군 복무 중이었고, 둘째 형과 막내 여동생은 시골에 남았다. 다섯 살 위인 누나와 두 살 위인 형, 그리고 나 이렇게 3형제가 부모님과 형제, 일가친적, 친구들이 있는 고향을 떠나 서방사거리 근처 호남전기(지금의 구 호전장례식장) 건너 편 골목에서 살게 되었다.
11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 곁을 떠나 살게 된 광주는 낯설고 크고 복잡한 도시였다. 첫 등교 후 선생님이 나를 소개하고, 자리에 앉고, 짝꿍과 동급생들에게 인사하고... 아마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느 해 여름 장대비 같은 소나기가 쏟아진 날 방죽 옆 작은 밭에 일하러 가신 어머니의 소쿠리엔 팔뚝만한 붕어 몇 마리가 들어있었다. “엄마 왠 붕어당가?” “응,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징게 방죽 물이 넘쳐서 무너미로 붕어들이 내려오더라. 그래서 소쿠리로 잡았다”. 추운 겨울날 아궁이 숯불에 구운 고구마를 당신 손 뜨거운 건 생각하지 않고 껍질을 벗겨 먹기 좋게 내어주시던 손길 등 수업 시간에 온통 엄마와의 추억만 생각났다.
주말이 간절하게 기다려졌다. 주말마다 엄마를 보러 고향에 갔다. 때로는 수업을 받다 책가방을 들고 문화동 버스터미널로 달려갔다. 고향 집에 도착해서 농사일 가신 엄마를 하염없이 기다렸다. 정말 감사하게도 평일에 무단 조퇴를 한 아들을 엄마는 단 한번도 나무라지 않으셨다. “오매 우리 아들 엄마 보러 왔능가?“하면서 꼬옥 안아주셨다. 그 포근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하해(河海)와 같은 사랑이 지금까지 나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 어머니와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 >
엄마 같은 누나
다섯 살 위인 누나는 내게 엄마 같은 존재다. 누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10여 년 동안 고향에서 농사짓는 어머니를 대신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달래주는 등 엄마 역할을 했다. 피아노를 잘 치는 누나를 위해 아버지께서 피아노를 사주셨고, 누나는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나도 누나한테 피아노를 조금 배웠다. 가장 기초인 바이엘은 배울만 했다. 그런데 체르니로 넘어가자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도저히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자 달래다 지친 누나는 처음으로 야단을 쳤다.
누나는 동신고 건너편 상가 1층에 있는 작은 교회인 북문교회에서 반주를 했다. 4학년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면 빵도 주고, 사탕도 준다는 말에 교회를 처음 갔다. 목사님과 성경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친구들도 사귀고, 맛있는 간식도 주는 주일이 기다려졌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핑계로 주일 예배를 빠지기 시작했고, 3학년 초부턴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
누나의 기도 덕분인지 광주은행을 퇴직한 후 어느 날 교회를 다시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광주은행 선배인 민동성 장로님을 통해 신안교회에 등록을 했다. 권사인 누나는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를 한다. 나도 누나를 위해 기도한다. 지금은 신안교회 집사로, 성가대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군대 가기 전까지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대해준 엄마와 누나 덕분에 나는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 고마움을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이다. 어릴 적에 엄마와 누나가 주신 사랑은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내내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다.
< 누나와 중학교 때 찍은 사진 >